

개인
2013-05-08 ~ 2013-05-14
이정명
무료
+82.2.737.4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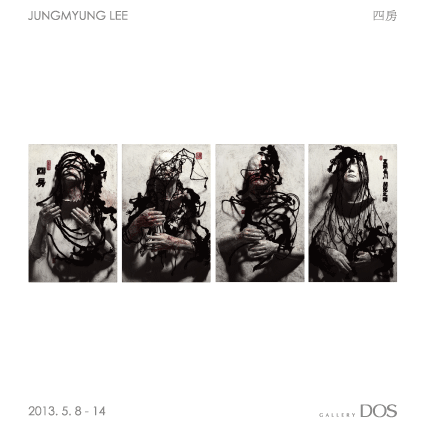
1. 전시개요
■ 전 시 명: 이정명 개인전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15-52 갤러리 도스 (Gallery DOS)
■ 전시기간: 2013. 5. 8(수) ~ 5.14 (화) 7일간
열람된 사물과 사물의 해독
『四房』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나의 4단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나의 잡다한 옷들에 관한, 나의 시간적 체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四房』은, 옷들에 얽힌 과거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현재 입장의 변화과정과, 그 변화과정을 반영한 미래 작품 계획의 전개과정, 이 세 가지 관계항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시간성에 관한 이러한 작업 진행 방식에 의미를 두자면,『四房』은 미래의 작품 계획이 모두 수립되었던 과거 그 시점에,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실물을 제작하는 작업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애초에 전제된 작업 진행 방식과는 별개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四房一篇(Room Quartets #1)』-「full-MENTAL-jacket(滿神之衣)」의 실물이 완성된 시점에 과거 기록물을 초록하여 작성한 것으로, 아직 실물이 없는 나머지「full-BLEEDING-sweater(滿血之袾)」「full-PLEATS-skirt(滿襀之裳)」「full-BODY-hat(滿身之冠)」시리즈에 관한 변 또한 사실상 이 글과 함께 모두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작품 제작기간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기가 곤란하다.
1. 4단 서랍장 속의 기억

설령 낡아 빠져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옷들이 있다. 정이 든 탓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뭔가 추억이 깃든 경우에도 아마 그러하리라. 이런 옷들 모두를 소장하며 살 순 없을 테고 결국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이때, 어떻게 버려야 옷에 서린 시간과 기억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인지, 나는 그 점이 늘 난감하였다. 다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는 걸까.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던져 넣다니, 도무지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물은 태워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마땅한 소각환경이 안될 뿐더러, 그렇다고 가스렌지에 굽기에는 도대체 운치가 없어 내키지 않았다. 난감한 뒤처리 문제를 미루고 쌓아온 덕분에, 입지도 않으면서 버릴 수도 없는 옷들을 나는 너무 많이 갖게 되었다. 나의 4단 서랍장 속은, 딱히 정돈된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닌 채, 그저 쟁여져 있기만 한 옷들로 가득하였다. 이를테면 이것은 마치 기억의 저장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봄날, 이런 옷들에 특단의 조처를 내릴 결심을 하고 말았다. 집안 청소를 하던 중 4단 서랍장 바깥으로 비쭉이 빠져나온 빨간 스웨터의 소매 자락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그 몰골이 어찌나 처량했던지, 어떻게든 해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여 비울 것은 비우고 보관할 것은 제대로 보관하자는 마음을 먹게 된 때문이었다. 서랍 사이에 끼여 늘어진 빨간 스웨터의 팔은, 정녕 늙은 개의 혀처럼 애처로웠다. 누가 기억해 줄까. 이것이 한때 몹시 생생한 빨간 색이었고, 짱짱한 탄력이 있었으며, 주인과 한 몸이 되어 그 시간 함께 움직이며 기억을 공유하던 사물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하였음이여. 내 너희를 청산하여 간직할 것은 고이 간직하되, 버릴 것은 그 기억마저도 말끔히 잊을 것이라. 그리하여 나의 4단 서랍은 새로움으로 다시 채워지리.
2. 夏雨長川 閱覽之物 - 여름비 쏟아지는 긴긴 시간, 사물을 열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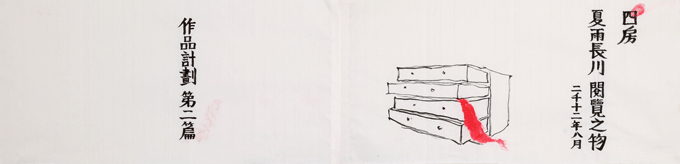
제법 큰 결심으로 감행한 옷 정리였음에도, 사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였다. 마지막 예를 갖춰보고자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쌓아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았고, 의외다 은근히 기뻐하며 서랍장 속에 차곡차곡 되넣었더니 충분히 수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정돈의 문제였을 뿐, 양호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급기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서랍들을 다시 탁탁 닫는 것으로 장시간에 걸친 옷 정리를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아마 정돈된 서랍 속을 바라보는 개운함에 옷의 처량한 몰골을 목도한 충격이 저만치 사라져버렸던 것이 아닐까 싶다. 기억을 잊고말고, 그런 따위에도 별 관심 없어졌었던 것 같다.
나의 4단 서랍장 속이 이렇게까지 정돈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지라, 이후 이따금씩 서랍장을 열어 그 속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옷들은 낡았거나 말았거나 나름대로 각이 잡혀 의젓하였고 서랍 속에서 열과 행을 맞추어 또한 반듯하였다. 도서관 사서가 빈틈없는 장서 목록을 열람하듯이 나는 그렇게 옷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심하면 아이템별, 계절별로 실물적 분류 체계를 바꿔보기도 하였고, 옷에 서린 시간과 기억을 반추하며 그 양상별로 추상적 체계를 구성하여 서랍장을 재정리하고 놀았다. 그러다 기억이란 것이 참 변하기도 쉽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에 생각이 미친 것을 보면, 그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기억을 재구성하며 놀았던 것 같다. 사물의 질서체계를 반복적으로 개편하여 이에 따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희안한 놀이를 하다보면 알 수 있게 된다. 끼워맞추기와 자리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은 그렇게 형태와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모호해져 간다. 어떤 과거를 ‘분명 이렇게 기억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거 시간에 대해 내려진 주관적 해석이나 특정한 이미지가 뚜렷한 것이며, 과거의 지각 경험에 의해 현재 지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터였다. 과거 시간을 특정 기억이나 이미지로 떠올리는 데에, 반드시 타당한 근거나 절대적 진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억에 대해 객관적 확실성, 신뢰성, 진정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 검열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해하기 쉬우면서 기만적이고 환상과 쉽게 섞이고 지어내기 쉬운” 것이 기억의 속성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말이다.
주야장천 비가 쏟아지던 지난 여름, 사물을 열람하여 그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3. 열람된 사물과 사물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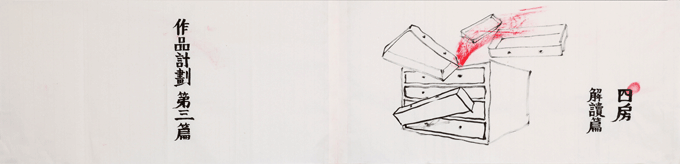
4단 서랍장 속 기억의 컬렉션. 과거 시간과 특정 기억이 수놓인 옷들의 집적. 만약 옛 교복을 지금껏 소장하고 있다면, 교복에 투영되어 기억하고 있는 학창시절이라는 과거 한 시절의 이미지가 있어, 그 이미지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싶은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빨간 스웨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그것에 실려 이미지 덩어리째 떠오르는 내 시간과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다. 설명하기 힘들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서랍장을 열 때마다 딱 그 옷 만큼의 형태와 양상을 띠며 분명 거기에 존재해 왔었기 때문이었다. 옷에 투사된 시간과 기억, 그 이미지들이 좋건 나쁘건 일단 저장해 두었었고, 버리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어떻게 버려야 옳은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었다. 나는 책장에 꽂힌 장서마냥 서랍장 속을 정리하고 수시로 체계를 바꿔가며 옷들을 열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 막연하고 불명료한 이미지들을 검증하여, 지극히 개인적 관점일 뿐이라 해도, 그 의미들을 논리적으로 해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진지한 열람취지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의미해독을 객관화 하면 할수록, 이미지를 쫓아 기억의 세부를 되짚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실한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져 다른 무언가로 얼렁뚱땅 모습을 바꿔 자리 잡는 것 같았다. 기억이란 얼마나 변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더란 말인가. 과거 시간에 대한 이미지는 기억에 의지해 현재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체제 자체가 유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변형되고 그 과정에서 왜곡되어 심지어 날조되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이미지의 진실 본질 근원 등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주관적 의미해독이 어떠했던가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물에 얽힌 기억 자체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이따금 곱씹어보는 정도가 옳은 것 같다. 다들 이것을 아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처럼 옷을 쟁여 기억 자체를 악착같이 되새김하려 들지 않는가보다. 잊혀지는 것은 잊을 만해서 잊게 되고, 잊고 싶지 않고 잊어서는 안될 무엇이라 해도 언젠가 결국 잊게 되는 것이 삶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래서 비울 것은 비우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사는 모양이다. 기억은 어차피 “추억을 서랍 속에 정리해 넣거나 장부에 기록해 두는 기능은 아닌 것이다.”
4단 서랍장에서 옷들을 추려내 동네 골목 귀퉁이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던져 넣는다. 우선, 또렷한 기억과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와 잊을 수 없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옷부터. 그러게. 이런 식으로 비워 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안녕. 너희가 어떠한 공정을 거쳐 무엇으로 재활용될 터인지 알 수 없으나, 사물에도 팔자가 있어 그들의 시간이 순탄하기도 하고 더러는 파란만장하더라고 친다면, 부디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물로 거듭나 곱게곱게 쓰임받길 바란다.
4. 그 기억은 이제 거기서 멈춘다
FAMILY SITE
copyright © 2012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이 페이지는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This page provided by Seoul Art Guide.
다음 브라우져 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This page optimized for these browsers. over IE 8, Chrome, FireFox,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