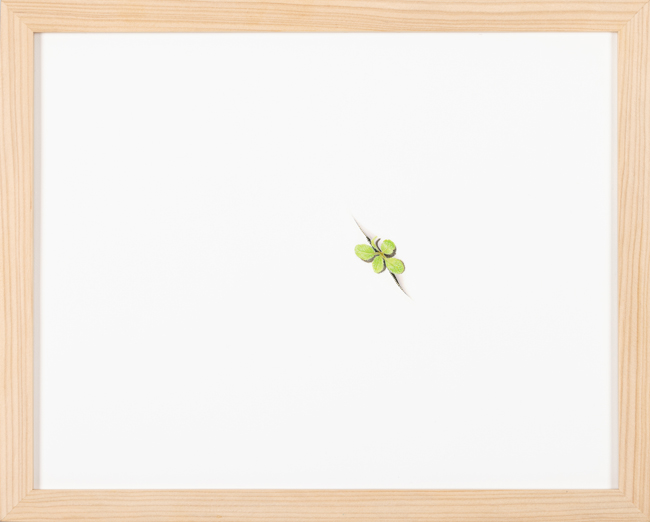김여운 개인전 <거기 있다> 전시 소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도스에서 회화 작품으로는 12년 만에 열리는 김여운 작가의 개인전 <거기 있다>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화려한 시각 경험을 배제한 색다른 전시이다. 언뜻 전시장이 텅 비어 보이는 것은 작가의 의도된 바이다. 작품 화면의 대부분이 비워져있고 한 부분에 아주 작은 풀이 밀도 높게 그려져 있는데, 작가가 작품에서 가장 그리고자 한 것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캔버스 너머로 뻗어내린 식물의 뿌리이다. 작품 속 풀들은 작가가 직접 발견한 것으로, 보도블럭과 아스팔트 사이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은 싹을 틔운 이름 모를 들풀들이다. 작품은 실제 사이즈에 가깝고 가까이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며, 원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관람시 돋보기가 제공된다. 풀들이 이겨낸 역경마저도 크기 만큼이나 별볼일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들만의 역경을 딛고 거기 있다.
아무리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없으면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작가는 말한다. 반면 뿌리가 있다면 첫번째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피고 지는 삶의 과정을 즐길 수 있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 혹은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과 같은 각종 사회의 틀과 타인의 기대치 속에서 살고 있다. 넘쳐나는 이미지들 속에 “나”는 없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작가는 활짝 피운 예쁜 꽃보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일이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 뒤에는 자라나서 비어있는 캔버스를 가득 채울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작품 속의 풀들은 나이자 너라고,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시에는 회화 작품들과 식물들이 살아있음을 심장소리로 표현한 사운드 그리고 설치 작품 1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김여운의 회화
이름 모를 들풀의, 혹은, 이름도 없는 것들의 윤리학
고충환 Kho Chunghwan | 미술평론
전시장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텅 빈 캔버스가 걸려있다. 하얀 캔버스에 하얀 사각형을 그린 절대주의 회화인가(말레비치). 아니면 회화가 가능한 필요충분조건을 평면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환원한 미니멀리즘인가(클레멘테 그린버그). 그도 저도 아니면 텅 빈 캔버스를 보고 당혹해할 사람들이라는 상황 논리를 겨냥한 개념미술인가. 미술사에서 보고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 전시를 통해 확인해본 적은 없는 만큼 텅 빈 캔버스가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환원주의 혹은 금욕주의와 결합한 후기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러도 좋겠군, 하고 돌아서려는데 얼핏 화면 속에 알 수 없는 얼룩이 보인다. 사실은 캔버스 천을 찢고 그 틈새로 고개를 내민 싹이 그려져 있었다. 실제로 전시장에 돋보기를 비치해놓기도 했지만, 그 실체가 손에 잡힐 듯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떡잎에 난 보송보송한 털이며, 캔버스가 찢어진 가장자리의 올 하나하나가 오롯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마저 생생한 것이 영락없는 실물 같았다. 작가가 오며 가며 본 이름 모를 들풀이라고 했고, 실물 크기 그대로라고 했다.
그러나, 저 큰 캔버스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작은 들풀 하나를 그렸다니. 정말 비효율적이군, 이라고 했지만 정작 작가는 그 말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작가는 회화적 관습을 문제시하고 있었다.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의미 포화 상태의 현대미술에 대해 꼭 필요한 말과 이미지로 한정하고 싶었다고 했다. 스펙터클 한 시대에 던지는 검소한(혹은 같은 의미지만 검약한) 말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한정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작가는 적정 거리 혹은 심적 거리를 문제시한다. 그림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리를 의미하며, 그림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같은 상황 논리에 확대 적용되는 개념이다. 작가는 그 거리, 그 개념을 수정하는데, 작가의 그림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선 그림에 바짝 다가가야 한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세심하게 보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채,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 본 채 지나치기 쉽다.
무슨 말인가. 앞서, 이름 모를 들풀이라고 했다. 이름도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좋을, 사실은 지천이지만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존재들이다. 이 미물들이 봄이면 언 땅을 깨고 고개를 내민다. 보도블록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시멘트 바닥을 뚫는다. 창틀에 쌓인 먼지에서도 자라고, 마침내 캔버스 천을 찢고 나온다. 혹자는 이처럼 새싹이 언 땅을 깨고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소리가 들린다기보다는 심적으로 공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존재에 대한 공감이다. 존재의 살림살이를 보기 위해선, 존재가 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선 존재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그 존재는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없다. 조르조 아감벤은 법으로부터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을 호모 사케르, 그러므로 발가벗은 생명이라고 했다. 작가가 그려놓고 있는 이름 모를 들풀들, 그러므로 이름도 없는 존재들에 대한 유비적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 미물들 그러므로 타자들이 사는 치열한 삶의 소리를 보고 듣기 위해선 주의 깊고 세심해야 한다. 겨우 보이고, 바짝 다가가서야 비로소 보이는 작가의 그림의 숨은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에는 다시, 타자의 삶에 대해 깊고 세심한 주의를 요청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이름 모를 들풀들, 그러므로 어쩌면 이름도 없는 존재들 하나하나에 작가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다. 안젤리나, 하나, 소피, 안나, 에바, 루이스, 미아, 버지니아, 리사와 같은. 그리고 관객들도 작가처럼 저마다 풀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요청한다. 연대를 요청해오는 관객참여형 프로젝트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는 김춘수의 시를 떠올리게 된다. 처음부터 이름도 없는 것들은 없다. 처음부터 무의미한 것들은 없다. 처음부터 미물(타자)들은 없다. 다만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를 발견하는, 타자를 인정하는 누군가가(혹은 행위가) 없었을 뿐. 그러므로 이름 모를 풀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이 프로젝트에는 타자(성)의 초대가 있고, 자기_타자의 맞아들임이 있다(에마뉘엘 레비나스).
그리고 여기에 집주인이 있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다. 집주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집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세 사는 사람이 이사 가고 난 뒤에 벽에 박힌 못을 발견했다. 아마도 집주인마저 눈치채지 못할, 쉽게 찾기는 힘든, 후미진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도 삶의 방법은 찾아지고 있었고, 치열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나의 인식(보다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름 모를 들풀처럼. 그러므로 작가가 그려놓고 있는 못 그림(정확하게는 벽에 못을 박은 그림)은 제도가 그어놓은 금을 넘어서 삶의 방책을 찾아내고야 마는, 여하한 경우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처럼 읽히고, 금기와 위반의 알레고리처럼 읽힌다. 그렇게 작가는 이름 모를(그러므로 어쩌면 이름도 없는) 들풀 같은 존재들의 치열한 삶의 순간에 주목하게 만들고, 후미진 구석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현실에 눈뜨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기둥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입체 설치작업이 있다. 세 개의 기둥이 마치 한 몸인 양 하나로 묶여 있는데, 하얗게 도색 된 표면에는 Life와 Variable(변수)과 같은 영문자가 기록돼 있다. 아마도 삶의 지침을 적어놓은 것일 터이다. 삶의 표상 혹은 푯대라고 해야 할까. 혼자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서로 기대어야 하고, 협동해야 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매개될 수 있다. 삶이 꼭 그럴 것이다. 김지하는 삶을 기우뚱한 균형, 그러므로 유격에 비유했는데, 아마도 변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작가는 인간다움이 본인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했다. 여기서 작가가 추구하는 인간다움이란 인간중심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제도에 반하는 인간, 제도의 잣대가 아닌 자기의 잣대로 서는 인간, 그러므로 자율적인 인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자율적인 인간 간 연대와 협동을 의미할 것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벌의 옷이 마치 한 몸인 양 하나로 들러 붙어있는 작업을 매개로 협동을 주제화한 요셉 보이스의 작업을 떠올리게 된다. 계몽(교육)을 매개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요셉 보이스의 사회조각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떠올리게 만든다.
발터 벤야민은 예술가를 망가진 세계를 수선하는 사람에 비유했다. 안젤름 키퍼는 세계를 불태워 내년 농사를 기약하는 화전민에 비유했다. 작가 역시 어쩌면 이런 수선공과 화전민에서 예술의 당위를 얻고, 예술을 위한 실천 논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이름 모를, 그러므로 어쩌면 이름도 없는 들풀 같은 존재들에, 후미진 구석에서 계속되는 치열한 삶의 순간들에,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 간 연대에 주목한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들, 나의 인식(보다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러므로 진즉에 거기에 있었던 존재들에 눈뜨게 만든다. 작가는 근작의 주제를 거기 있다, 라고 명명한다. 아마도 진즉에 거기에 있었던 존재를, 거기에서의 치열한 삶의 현실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김여운
2023 현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사업 장기입주 작가
학력
2007 서울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3 거기 있다, 갤러리도스 공모당선전, 서울
Pic Cell, 아웃오브더박스 버티박스, 서울
2017 1.2.4., 사이아트 도큐먼트 공모당선전, 서울
Anti-Standard, Artifact Gallery 공모당선전, 뉴욕
2016 Revealing Imperfection, 스페이스 옵트 공모당선전, 서울
2011 Circle of Life, Life of Circle 아트스페이스 개관초대전, 홍콩
house of THE HUNTED, 롯데갤러리 초대전, 롯데백화점 일산점, 일산
2010 house of THE HUNTED, 갤러리 엠(청담동) 초대전, 서울 외
그룹전
2016 Tokyo International Art Fair, 오모테산도힐스, 도쿄
2015 The Voice of the Artist, ArtScope, 마이애미
아트로드 77, 갤러리 논밭, 헤이리
꿈과 마주치다-공모당선전, 갤러리일호, 서울
2014 Thank You!, 롯데백화점 잠실
아트바겐, 갤러리토스트, 서울
2012 Parallax Art Fair, Chelsea Old Town Hall, London
2011 IYAP-스팩타클의 사회, 인터알리아, 서울
나비의 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0 메리 크리스마스, 가나아트센터, 서울
Korea Tomorrow, SETEC 3전시실, 서울
동방의 요괴들 in the city, 충무아트홀, 서울 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1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버몬트, 미국
2009 프레리 아트 센터, 일리노이, 미국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길드, 뉴욕, 미국
Articles
2016 NewYorkio.com, Exclusive Interview, 2월
2010 CNB 저널 187호, 표지작가, pp.52-54
Art on TV 인터뷰, 8월
월간 객석 8월호, 인터뷰, p.191
버질아메리카 5-6월호 pp.90-93
Angelina
Oil on Linen, wood frame
134.3(h) x 166.1(l) x 4(d) cm
2023
Sophie
Oil on Linen, wood frame
37.9(l) x 30.4(h) x 2.9(d) cm
2023

Three Poles
Gesso and acrylic on wood poles, jute rope
3 poles 165 x 8cm each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