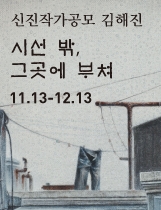김해진
사회변화와 주거양식의 개편으로 오늘도 건물들은 부서지고 다시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 더 나은 환경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에 힘입어 도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숨바꼭질하던 골목이 사라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사라지고 추억할 수 있는 거리와 풍경들이 사라진다. 시간(세월)의 흔적(때)가 덕지덕지 묻은 공간이 무너진다. ‘누구누구의 집이었고 무엇을 했었지’라는 그 존재는 지워지고 개인적인 추억을 오로지 개인적인 것으로만 남긴 채 그 장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오래된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현재 눈앞에서 붕괴, 소멸, 사라짐을 목격하는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니다. 언젠가는 과거의 현장은 없어지고 현재만 남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짓다가 만 건물,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건물이나 옥상 등 특정적 장소를 소재로 설치, 드로잉, 회화로 담아 낸다. 벽면에 시멘트로 드로잉 한 작품들이다. 본드나 다른 첨가물이 없이 시멘트로만 벽면에 집을 짓듯이 바르거나 액션을 담아서 표현한다. 그리고 전시기간 동안 시멘트 덩어리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언젠가’ 소멸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를 대변한다.
건물을 ‘짓는’ 시멘트로 전시공간의 흰 벽면에 마치 미장이가 시멘트를 바르듯 건물을 그린다. 도시의 건물들 대부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것에 착안하여 시멘트로 그림을 올린다. 페인트가 잔뜩 묻은 롤러로 벽을 칠하는 것처럼, 나는 롤러로 풍경의 밑그림을 그린다. 도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쓰윽 쓱 희멀건 시멘트 물이 벽에 묻어난다. 그 밑그림에 마치 ‘놀이’처럼 시멘트 덩이를 던지고 문지른다. 거대한 풍경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 온전한 건물이 아닌 무너지듯 부유하는 불완전한 건물들의 풍경이다. 이풍경은 나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며 벽면에 풍경을 짓는 그 행동을 통해, 나의 기억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풍경은 현실적 풍경이 아닌 상상의 풍경이다. 이 풍경은 상상의 풍경이지만 기억의 풍경이다.
그리고 곧 사라질 풍경이다. 이 풍경은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붕괴되며 전시가 끝남과 동시에 파괴가 예고된 풍경이다. 조금만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그 풍경의 조각들은 툭하고 무너질 기세다. 온전한 형체의 건물이 아니라 벽면에 불완전한 재료로 세워진 이 건물들은 조만간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한 실체이다. 이것은 ‘언젠가’ 소멸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를 대변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풍경이 있다. 인적이 없는,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는 없는, 텅 빈 공간이 조망된 옥상풍경이다. 대부분 회화작업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옥상이다. 배경과 같은 색조를 띠며 그 존재를 미미하게 드러내는 이 옥상에는 빨래를 널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세 개의 줄과 그 줄을 지탱하고 있는 T자 형태의 막대,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난간에 위태하게 올려진 화분이 있다. 오르내리는 계단은 보이지 않는다. 인적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사람들의 왕래와 번잡한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듯 보이며 안개와 울창한 숲에 싸여 있다. 역시 인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는 더 많은 사물들이 있다. 빨래줄, 에어컨 실외기, 벽돌 등이 있고 줄에는 빨래집게가 걸려있다. 이 빨래집게로 사람의 온기가 그나마 느껴지기는 하나 역시 썰렁한 옥상풍경이다. 옥상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사다리가 걸쳐 있다. 이 공간은 원래는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여유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임시로 놓인 것이다. 이 사다리는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은 다가올 수 없으며 이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 되며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주변의 환경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풍경은 버려진 풍경이다. 안개에 휩싸인 풍경은 실체가 불완전한 풍경이다. 사람이 떠난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다. 짓다만 건물, 불타고 있는 건물,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건물 등이 그려진 드로잉에도, 캔버스에 그려진 옥상도, 그리고 시멘트로 만들어낸 거대한 풍경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 풍경은 낯설지 않다. 이것은 우리 동네 풍경일 수도 있고 우리 도시의 풍경 일수도 있다. 골목을 돌다 마주하는 풍경이고 우연히 지나치는 거리의 풍경이기도 하다. 살았고 놀았던 단순한 공간적 개념의 풍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의 기억들이 함께하는 체감한 추억의 공간이다. 그러기에 풍경은 버려진 풍경이 아니라 ‘풍경’으로 남는다. 이는 풍경의 ‘현장성’을 표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고 사라질 풍경이지만 지금 이곳에,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하는 그것은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