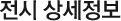상세정보
노혜리. 혜리 크리스티나 메리 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 중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녔으며, 한국에서 대학교를,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한다.
노혜리와 그의 작업을 설명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 문구들은 그의 삶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작업에 깊숙이 연결하고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노혜리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익숙하며, 빠르게 짐을 꾸리는 것에도 선수이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언어를 전환하고, 짧은 단어들로 긴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능숙하다. 마치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척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도 탁월한 면이 있다.
전시 ⟪August is the cruelest⟫에서 노혜리는 여름, 이동, 여정, 이별과 상실을 둘러싼 기억을 펼쳐 놓는다. 모든 생명이 그 성장의 정점에 있는 싱그러운 여름의 한 중간에서 곧 져버리고 말 것들을 떠올리며 느끼는 고독과 상실감은 때론 그 무엇보다 쓸쓸하다. 유난히도 지독한 열기가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여름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간 특정한 대상을 연상시키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에 머물렀던 노혜리의 사물(Object)은 최근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여행’과 ‘이동’을 암시하는 이번 전시의 사물들은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안과 밖이 뒤집히거나 비틀린 형태로 전시장에 놓여있다. 달릴 수 없는 차, 누울 수 없는 텐트, 항해할 수 없는 카약에는 노혜리와 아버지, 두 사람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자동차 안은 그 독특한 거리감으로 인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때보다 한층 미묘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니로〉(2024)는 노혜리의 아버지가 몰던 기아의 자동차, ‘니로’를 본떠 만든 작품이다. 이동수단이 곧 생계 및 생존과 결부된 미국에서 자동차는 단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삶의 형식과 범주를 결정짓는 남다른 위상을 갖는다. “메이드 인 코리아”. “기왕이면 국산.” 자신을 둘러싼 두 세계의 문턱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선택지를 갖기 어려운 상태는 저절로 얻게 된 것, 혹은 내 것이었던 듯한 기억에 의지한 회귀적 선택들을 만들어 낸다. 자동차의 뒷좌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창 너머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은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횡단의 감각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누군가는 가지 못한, 끝내 가지 못할 미지의 장소를 상상하게 한다.
한편, 〈캐리〉(2025)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듯한 작은 사이즈의 텐트로, 그마저도 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서는 혼자여도, 누군가와 함께여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텐트는 휴대가 가능하도록, 잘 휘는 성질의 철사로 가볍게 제작된다. 그러나 노혜리의 텐트는 단단한 쇠 파이프를 하나하나 이어 붙여 각이 져 있고 접을 수 없다. 내부를 감추기 위해 견고하기 마련인 텐트의 커버는 오히려 그 속이 어렴풋이 감지될 만큼 반쯤 투명하고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다. 이동도, 정착도 어려워진 이 불완전한 쉼터는 그 안에 본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시공간을 품고 있다.
좁고 긴 복도의 끝에는 〈카탈리나〉(2024)가 있다. 카약은 망망대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나 그에 버금가는 위험과 맞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카약은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믿고, 손발을 맞추는 것을 이동의 절대적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앙상한 몸체로 천장에 매달려 수직으로 직립한 〈카탈리나〉는 땅에서도 물에서도 원래의 방식대로 존재할 수 없다. 바다를 건너며 표류하게 된 ‘함께’라는 감각은 좁은 공간 안을 맴돌고 있다. 이제 다시 긴 복도를 걸어 나가야만 한다.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뒤집힌 사물, 조각난 단어, 미완의 움직임은 하나의 편지가 된다. 내용을 단숨에 읽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노혜리는 그 불가능성에 기대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수신인을 향한 메시지를 남긴다. 수신자가 부재하는 편지를 쓰고 읽는다는 것은 사라진 대상이 남긴 기억을 끌어안으려는 자기 고백적 행위이자, 내가 가진 가장 사적인 것들로 외부와 연결되고자 하는 몸짓이다. 빈 종이에는 끝맺지 못한 이야기, 세월이나 시간, 여러 이름과 단어들이 뒤덮여 있다. 언젠가 편지는 도착할지도 모른다.
노혜리(b.1987)는 사물과 몸을 연계하여 말하는 작업을 한다. 카날 프로젝트(2024, 뉴욕, 미국)과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2022, 서울), 갤러리777(2017, 양주)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수림큐브(2024, 서울), 빌리타운(2024, 헤이그, 네덜란드), AHL 파운데이션 갤러리(2024, 뉴욕, 미국), 리움미술관(2022, 서울), 일민미술관(2019, 서울), 하이트컬렉션(2017, 서울),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2017, 미네, 일본) 등 국내외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두산아트랩 전시 2017》(2017,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서울)에 선정되었다.
* 전시 제목은 싱가포르 밴드 The Observatory의 2016년 곡 ‘August is the cruellest’에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