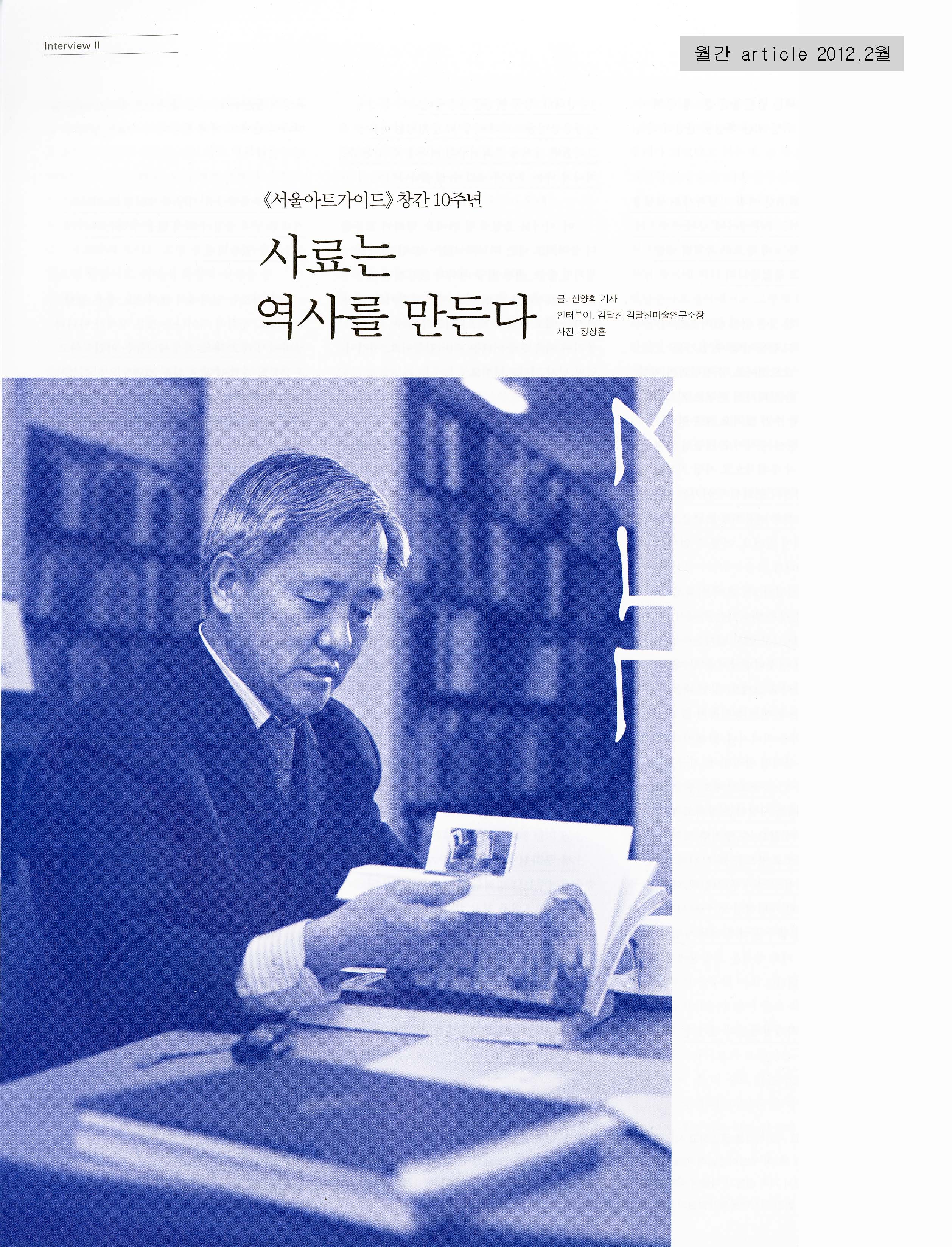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10주년_사료는 역사를 만든다
글. 신양희 기자
인터뷰이. 김달진미술연구소장
사진. 정상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서울아트가이드》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다. 12단 접지에서 출발한 이 미술정보지는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가지(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무료로 배포하는 정기 발행의 신문이나 잡지)가 되었다. 그야말로 이름처럼 미술안내를 잘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의 노력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김달진’이라는 브랜드 때문일 것이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김달진 대표를 만났다.
10주년을 맞은 정보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 “처음 만들 때 확신도 없었고 염려도 많았다.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가지였기 때문이다. 콘텐츠 부분에서도 서서히 충실해 갔다고 생각한다. 국내 권위 있는 필자들의 칼럼, 따끈따끈한 국외 전시 소식, 신간 안내 페이지도 2-3페이지나 된다. 한 달간 미술계의 여러 동향 등은 유가잡지들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무가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갔고, 3-4년 지나면서 효과가 드러났으며 탄력이 붙었다. 지금 국공립 미술관, 메이저 화랑 등 다방면으로 광고가 들어온다.”
전시공간과 빽빽한 전시일정, 지도 제공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광고효과로 이어진다. 허나 일각에선 벌기만 하지 쓸 줄 모른다는 푸념도 나온다. 광고로 넘쳐나지만 늘 후원 받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등의 따가운 시선도 아예 없진 않다. 이것이 《서울아트가이드》의 진정성까지 불똥이 튀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여 비판이 있는가를 묻자 창간 10주년 독자설문을 보여준다. “무료이면서도 내용이 알차다,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아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전시소식을 가장 손쉽게, 그것도 무료다”라는 칭찬부터 “월별이나 계절별로 특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이론가, 기획자 등의 얘기도 듣고 싶다.” 등등 건강한 조언까지. 어쩌면 이 정보지의 매력은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서울아트가이드》의 모체는 ‘김달진 미술연구소’(2001년 개소)다. 연구소는 “2002년부터 미술정보포털사이트www.daljin.com와 오프라인 매체《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했다.” 또한, 미술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1차 작업에서부터 의미를 만들고 해석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쉽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차차 수행해 나갔다. “미술자료실은 2007년 개관했을 때부터 자료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서울시 2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한 것은 그간 해왔던 작업들의 발전이며 공적인 형태다. 김달진이라는 이름 대신 ‘한국’을 앞에 붙이고 싶었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다.”
박물관 개관전은 <미술 정기간행물 1921-2008>이었다. 전시작품이 정기간행물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이후로도 사료를 바탕으로 여러 전시와 연구물을 생산했다. 기획전에 출품되는 사료들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 개인 기증, 대여 등을 통해서 이뤄지고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희귀한 사료들은 경매를 통해 구매하기도 한다. 사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은 좀 더 엄격한 2차 문헌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그것들을 토대로 한 기획전 등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적 기반 아래 분류되고 연구된 것이고, 전시도록 또한 미술사적 가치를 가진다. 물론 이것을 분류하고 연구한 결과물은 선택된 역사일 것이다.
작년 “《서울아트가이드》의 ‘이 작가를 추천한다.’ 코너에서 소개되었던 작가들을 모아 갤러리 숲에서 전시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_전개와 위상 전(展) 을 바탕으로 한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 60년』이 발간됐다. 이 책은 95년 『바로 보는 한국현대미술』에서 50년부터 90년까지 일차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 올해 “계획 중에는 해외미술이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어왔느냐는 주제로 전시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도 역시 사료로 보는 전시가 될 것이다.”
기획의 축적은 전시를 가능하게 했고, 미술사적 작업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료에 대한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사실 모자라다. 지금도 업데이트되고 있는 미술계의 수많은 사건. 그리고 아직도 쌓여 있는 과거 사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국가에서 아카이브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도 조금만 지나면 역사가 된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남겨두는 일이 필요하다.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김 대표의 말은 결코 교과서적인 말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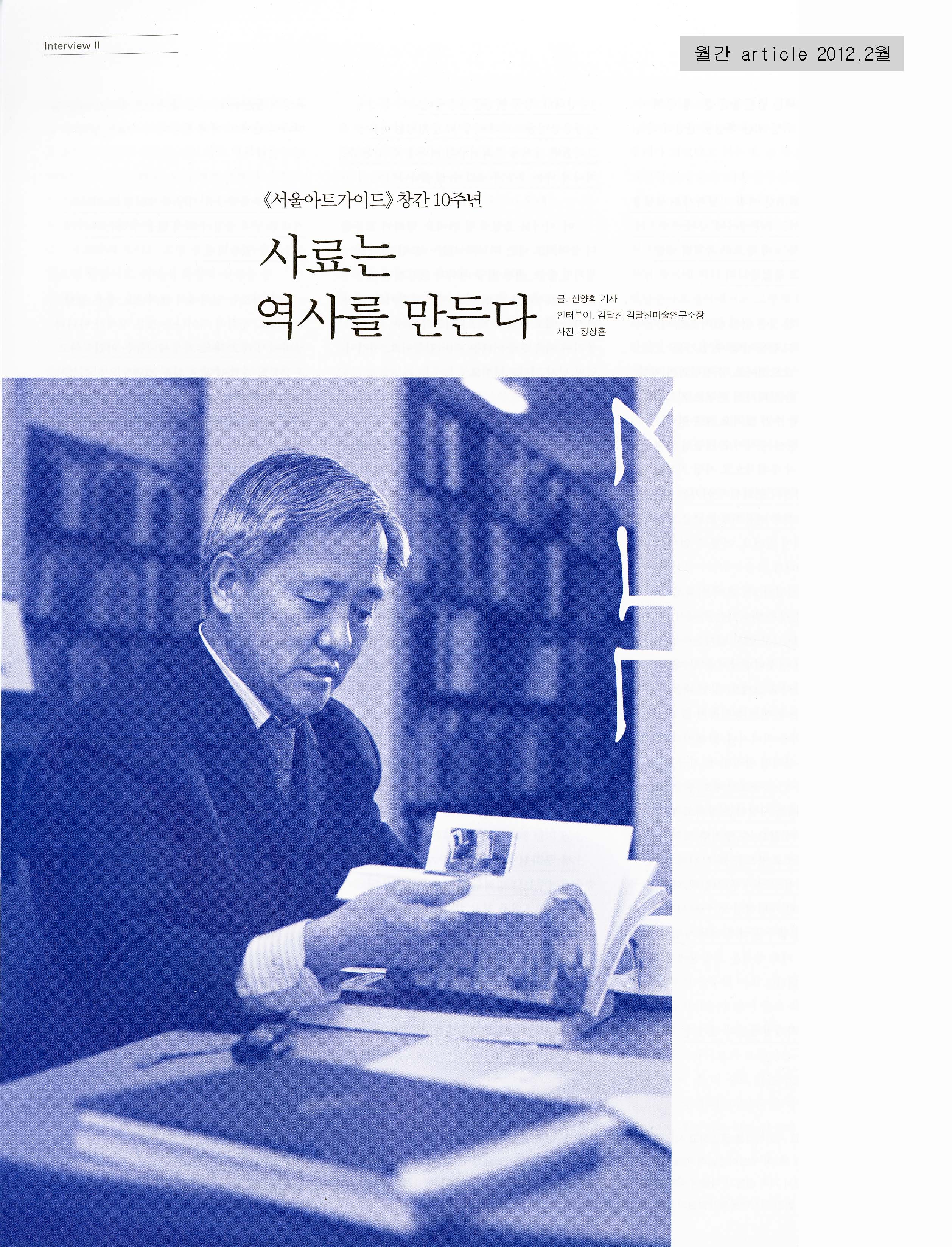

 0
0
 0
0